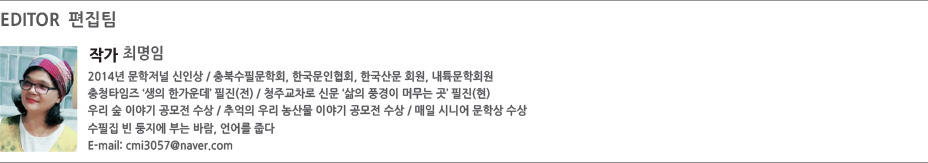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어우렁그네
2024-04-03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어우렁그네
'글. 최명임'
고운 요정이 요람에서 놀다가 채롱을 벗어났다. 방문 틀에다 그네를 달아주었더니 네 활개를 파닥이며 좋아라, 한다. 눈만 뜨면 그네에 올라 헤벌쭉 웃는데 쌍둥이라 서로 타겠다고 앙알거린다. 걸음마를 시작하고는 보이는 것마다 신기한지 발탄강아지처럼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어느새 놀이터에서 바람 소리를 내며 그네를 탄다.
놀이터에 가면 별의별 놀이기구가 아이들을 기다린다. 미끄럼틀과 시이소, 철봉과 흔들놀이, 클라이머 등등. 그 모두를 섭렵하면서 땀이 흥건하여도 그네를 타야만 끝을 본다. 아이들 마음은 같아서 오종종 모여서 차례를 기다린다. 쌍둥이는 안달이 나면 할미를 불러 세워 놓고 총알같이 달려가 미끄럼틀을 한바탕 타고 온다. 마지못해 그네에서 내리는 아이도 미련이 남고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곁눈질로 훔쳐보면서 마음을 두고 있다.
쌍둥이 차례가 왔다. 기다리는 눈빛들이 안타까워 얼른 쌍둥이 그네를 타자고 중재에 나섰다. 효가 먼저 그네에 오르고 율이 성큼 따라 오르다가 균형을 잃고 땅으로 고꾸라졌다. 그 바람에 효가 밀리고 그네가 푸르르 떨었다. 놀란 효가 투정을 부리고 툭툭 털고 일어난 율이 찔끔 나온 눈물을 훔쳤다. 기다리는 초롱초롱한 저 눈빛들 때문에 얼른 타자고 재촉하였다. 다시 그네에 오른 두 녀석이 한꺼번에 발을 구르다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분란이 인다. 둘이 타협을 보았는지 율이 먼저 발을 구르며 배를 쑤욱 내밀었다. 간신히 한 뼘 나가는가 싶다가 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다. 효가 제 깐에는 잔뜩 힘을 주고 발을 구르건만, 제자리걸음이다. 다시 한 번 율이 엉덩이를 쑤욱 빼더니 얼굴이 벌게지도록 발을 구른다. 녀석들이 흔들리는 그네에서 용을 쓰더니 마침내 요령을 터득한 듯 오락가락한다.

날개를 단 듯 바람 일구는 소리 요란하다. 힘을 주거니 받거니 고운 나비 한 쌍이 공중에서 어우렁그네를 탄다. 세상으로 당찬 출발이다. 이란성 쌍둥이가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이 춘향이 그네로 이어진다. 우여곡절 끝에 행복을 찾아가는 춘향전에서 그네는 인연의 끈이며 기생 딸 춘향이가 세상과 조율하는 통로이다. 신분 타파를 시도하는 작자가 그 안에서 통쾌하게 담을 뛰어넘는다.
어렸을 때 풍경이 떠오른다. 아이들에게는 온갖 자연물이 놀이 기구였다. 두루 섭렵하고도 속이 덜 차는 날은 어둠이 어스름 깔리는 운동장을 찾았다. 동무와 어우렁그네를 타고 하늘을 날면 남아 있던 열기가 탈골된 그네에서 땀으로 흩어졌다. 삐걱대는 쇳소리도 고저장단으로 리듬을 타고 웃음소리가 빈 운동장을 돌아다녔다.
그네는 혼자보다 둘이 탈 때가 더 재미있었다. 하지만 호흡을 맞추는 일은 그리 수월하지가 않았다. 옹색한 디딤판에 네 발을 가지런히 놓고 한 그네에 매달려 땅을 박차고 비상을 시도하는 것, 그 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해낼 수가 있기에. 마침내 둘이서 하늘을 나는 그 환희를 기억하는 이들 많을 것이다.
더불어 가는 인생 아옹다옹하지만 말고 어우렁더우렁 어울려 살자는 의미에서 앞에 말 뚝 떼어다가 어우렁그네라 지었을 거다. 타다가 하나가 추락하여도 다시 손잡아 올려 몸과 마음을 부비며 함께 타는 그네 그것이 인생이려니. 쌍둥이 녀석들이 대견하게도 어우렁그네를 탄다. 그네 꼬리를 붙들고 눈이 오락가락하는 할미의 노파심을 뒤로하고 웃음 범벅이 된 아이들이 공중에서 깃발처럼 펄럭인다.
한 탯줄에 엮여 한 날 한 시에 나와 서로의 시선밖에 떨어져 본 일이 없는 녀석들이다. 어른이 되거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화합하고 저의 주인이 제가 되길. 지금처럼 나중에도 둘이 어우렁그네를 타고 동천으로 날기를 기도한다.

부부의 인연 또한 전생에 쌍둥이였던 둘이 칠천 겁의 시간을 지나, 오작교를 건너와 현생에서 하나가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가 한 그네에 올라 어우렁그네를 타는 일이다. 처음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생긴 이래 그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녀와 생육(生育)의 신성한 섭리를 부여받고 신세계를 열어가는 여정이리라. 그 여정에 웃음꽃만 피랴.
혼자는 외로워서 둘이 되었다는, 둘이 되었더니 셋이 좋고 넷이 되어야 완성일 것 같다는 며늘아기의 홍조 띤 말에서 인연의 끈을 짐작해 본다. 어느새 그녀의 가족은 넷이 되었다. 어우렁그네에 올라 함박웃음 웃으며, 때로 흔들리며, 아옹다옹, 눈물 찍으면서도 힘껏 발을 구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자칫 추락할지도 모르는 그네의 속성을 알고도 우리는 그네에 오른다. 목표는 행복 지향적 삶이다. 땅도 하늘도 아닌 허공에서 작은 판목 하나와 두 줄에 의지하고 행복해지는 일이 쉬우랴만. 그네를 타다가 태풍을 만나거든 호흡을 가다듬고 초심을 발판으로 삼아 힘껏 발을 굴러보기를, 제자리걸음에 겁먹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삼 세 번인들 못하겠는가. 마침내 그네에서 내렸을 때 잘 놀았노라고 웃으며 돌아서야 할 테니.
동천에 올라 웃음꽃 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의 아이들이, 세상 모든 지어미와 지아비들이….
놀이터에 가면 별의별 놀이기구가 아이들을 기다린다. 미끄럼틀과 시이소, 철봉과 흔들놀이, 클라이머 등등. 그 모두를 섭렵하면서 땀이 흥건하여도 그네를 타야만 끝을 본다. 아이들 마음은 같아서 오종종 모여서 차례를 기다린다. 쌍둥이는 안달이 나면 할미를 불러 세워 놓고 총알같이 달려가 미끄럼틀을 한바탕 타고 온다. 마지못해 그네에서 내리는 아이도 미련이 남고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곁눈질로 훔쳐보면서 마음을 두고 있다.
쌍둥이 차례가 왔다. 기다리는 눈빛들이 안타까워 얼른 쌍둥이 그네를 타자고 중재에 나섰다. 효가 먼저 그네에 오르고 율이 성큼 따라 오르다가 균형을 잃고 땅으로 고꾸라졌다. 그 바람에 효가 밀리고 그네가 푸르르 떨었다. 놀란 효가 투정을 부리고 툭툭 털고 일어난 율이 찔끔 나온 눈물을 훔쳤다. 기다리는 초롱초롱한 저 눈빛들 때문에 얼른 타자고 재촉하였다. 다시 그네에 오른 두 녀석이 한꺼번에 발을 구르다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분란이 인다. 둘이 타협을 보았는지 율이 먼저 발을 구르며 배를 쑤욱 내밀었다. 간신히 한 뼘 나가는가 싶다가 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다. 효가 제 깐에는 잔뜩 힘을 주고 발을 구르건만, 제자리걸음이다. 다시 한 번 율이 엉덩이를 쑤욱 빼더니 얼굴이 벌게지도록 발을 구른다. 녀석들이 흔들리는 그네에서 용을 쓰더니 마침내 요령을 터득한 듯 오락가락한다.

날개를 단 듯 바람 일구는 소리 요란하다. 힘을 주거니 받거니 고운 나비 한 쌍이 공중에서 어우렁그네를 탄다. 세상으로 당찬 출발이다. 이란성 쌍둥이가 그려내는 한 폭의 그림이 춘향이 그네로 이어진다. 우여곡절 끝에 행복을 찾아가는 춘향전에서 그네는 인연의 끈이며 기생 딸 춘향이가 세상과 조율하는 통로이다. 신분 타파를 시도하는 작자가 그 안에서 통쾌하게 담을 뛰어넘는다.
어렸을 때 풍경이 떠오른다. 아이들에게는 온갖 자연물이 놀이 기구였다. 두루 섭렵하고도 속이 덜 차는 날은 어둠이 어스름 깔리는 운동장을 찾았다. 동무와 어우렁그네를 타고 하늘을 날면 남아 있던 열기가 탈골된 그네에서 땀으로 흩어졌다. 삐걱대는 쇳소리도 고저장단으로 리듬을 타고 웃음소리가 빈 운동장을 돌아다녔다.
그네는 혼자보다 둘이 탈 때가 더 재미있었다. 하지만 호흡을 맞추는 일은 그리 수월하지가 않았다. 옹색한 디딤판에 네 발을 가지런히 놓고 한 그네에 매달려 땅을 박차고 비상을 시도하는 것, 그 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해낼 수가 있기에. 마침내 둘이서 하늘을 나는 그 환희를 기억하는 이들 많을 것이다.
더불어 가는 인생 아옹다옹하지만 말고 어우렁더우렁 어울려 살자는 의미에서 앞에 말 뚝 떼어다가 어우렁그네라 지었을 거다. 타다가 하나가 추락하여도 다시 손잡아 올려 몸과 마음을 부비며 함께 타는 그네 그것이 인생이려니. 쌍둥이 녀석들이 대견하게도 어우렁그네를 탄다. 그네 꼬리를 붙들고 눈이 오락가락하는 할미의 노파심을 뒤로하고 웃음 범벅이 된 아이들이 공중에서 깃발처럼 펄럭인다.
한 탯줄에 엮여 한 날 한 시에 나와 서로의 시선밖에 떨어져 본 일이 없는 녀석들이다. 어른이 되거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화합하고 저의 주인이 제가 되길. 지금처럼 나중에도 둘이 어우렁그네를 타고 동천으로 날기를 기도한다.

부부의 인연 또한 전생에 쌍둥이였던 둘이 칠천 겁의 시간을 지나, 오작교를 건너와 현생에서 하나가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가 한 그네에 올라 어우렁그네를 타는 일이다. 처음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생긴 이래 그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녀와 생육(生育)의 신성한 섭리를 부여받고 신세계를 열어가는 여정이리라. 그 여정에 웃음꽃만 피랴.
혼자는 외로워서 둘이 되었다는, 둘이 되었더니 셋이 좋고 넷이 되어야 완성일 것 같다는 며늘아기의 홍조 띤 말에서 인연의 끈을 짐작해 본다. 어느새 그녀의 가족은 넷이 되었다. 어우렁그네에 올라 함박웃음 웃으며, 때로 흔들리며, 아옹다옹, 눈물 찍으면서도 힘껏 발을 구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자칫 추락할지도 모르는 그네의 속성을 알고도 우리는 그네에 오른다. 목표는 행복 지향적 삶이다. 땅도 하늘도 아닌 허공에서 작은 판목 하나와 두 줄에 의지하고 행복해지는 일이 쉬우랴만. 그네를 타다가 태풍을 만나거든 호흡을 가다듬고 초심을 발판으로 삼아 힘껏 발을 굴러보기를, 제자리걸음에 겁먹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삼 세 번인들 못하겠는가. 마침내 그네에서 내렸을 때 잘 놀았노라고 웃으며 돌아서야 할 테니.
동천에 올라 웃음꽃 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의 아이들이, 세상 모든 지어미와 지아비들이….